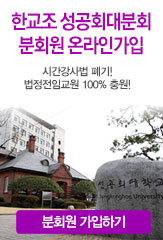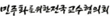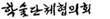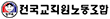“교양강좌 담당강사 120명 필요한데 30명만 채용” - 교수신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11 16:54 조회10,75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강사법’에 대처하는 대학의 셈법
2015년 12월 11일 이상룡 부산대 강사
부산에 있는 모 국립대 일이다. 이 대학은 해마다 이맘때면 교양교육원 강의를 담당할 강사를 선발한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선발공고를 냈다. 공고엔 “강사법이 시행되면 선발이 취소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려있었다. 아니나다를까 며칠 뒤 공고를 취소한다는 공고가 다시 났다. 강사법 시행이 확정될 때까지 중단한다고. 그렇게 모든 일이 미뤄졌다.
그리고 교양교육원에서 개설하는 강좌를 조정하기 위한 전임교원들의 모임이 예정됐다. A강좌와 B강좌에는 각각 60여 명의 강사가 필요했다. 물론 이 모임은 두 강좌의 강사 배정을 조정하는 작업을 위해서 열린 것이다.
둘 중 하나의 강좌가 없어지면 절반에 해당하는 최소 60명의 강사가 해고된다. 여기에 더해 ‘책임시수 9시간’을 채워야 하는 강사법이 시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들 강좌를 맡고 있는 강사들은 개인당 4시간을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산상 살아남은(!) 60명 중 또 다시 절반이 더 해고될 것이다. 결국 120명의 강사 중 30명만이 강의를 배정받게 된다. 대략 90명의 강사가 대학에서 쫓겨나야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강사법이다.
대구지역의 모 대학 음악대학에서도 강사 채용공고가 났다. 강사법이 시행된다고 하니 ‘4대 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만’ 신청하라고 했다. 대학 바깥에서 이미 4대 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직장인만이 대학에서 강의를 맡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는 “우리 대학은 강사들에게 4대 보험료를 내줄 수 없다”는 말이 아닌가? 이것이 강사법이다.
강사법이 강제하는 것은 이것이다. 강사법은 법이다. 어떤 불이익이 닥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강사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모든 강사에게 법률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줄 여력이 있는 대학은 적어도 대한민국에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럴 의사도 없다. 왜냐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기 때문이다.
강사를 채용하되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 많다. 이미 임용된 전임교원들에게 강좌를 맡길 수 있는만큼 맡기거나 이미 4대 보험을 받고 있는 사람인 겸임·초빙 교수를 최대한 채용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래도 안 되면 수강인원을 크게 늘려 강사가 맡을 강좌 수를 줄이면 된다. 그렇게 하면 강사를 최소한으로 뽑을 수 있다. 이것이 강사법에 대처하는 대다수 대학들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갈까?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대학교원들의 연구와 교육권이 축소되고, 학문후속세대는 쪼그라들고, 결국 대한민국의 학문 수준과 교육이 황폐화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란 것을 대학구성원들은 모두 알고 있다. 그래서 강사법이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강사법을 저지할 힘이 없는 강사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초조해하고 있고, 강사법 시행을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은 걱정만 늘어놓는 것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실정이다. 모두가 “자신은 강사법을 해결할 권한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는 동안, 모든 이가 걱정 속에 침몰하는 세월호를 지켜봤듯 지금 대학도 그렇게 가라앉고 있다.
이상룡 부산대 강사·철학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